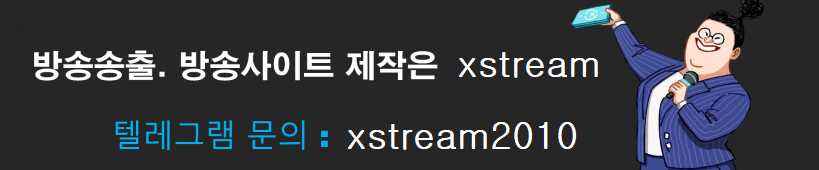'한국인의 밥상' 속 김치찌개, 감자전, 미역국, 삼치조림, 떡볶이 소개
컨텐츠 정보
- 731 조회
-
목록
본문
3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은 "토박이만 안다" 진짜 고향의 맛 편으로 꾸며진다.
태어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뚝심 있게 지켜가는 맛. 진짜 고향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정!
고향은 늘 그리운 감정을 동반한다.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다. 요즘 같은 때, 태어난 곳에 뿌리 내리고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한 곳에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온 사람을 우리는 '토박이'라고 부른다. 그들도 젊었을 땐 도시의 삶을 갈망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고향은 그들에게 평생 삶의 터전이었고, 도시로 떠난 이들이 아스라한 추억으로 떠올리는 고향의 맛이 그들에겐 일상에 올라오는 밥상이 된다. 시대가 변하고 취향도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음식의 맛과 경험은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음식은 한 시대를 이해하는 역사이자 삶의 기록이기도 하다. 고향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뚝심 있게 지켜가는 '토박이만 아는 진짜 밥상'을 만나러 가 본다.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은 태백산의 지붕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악지대. 구름도 쉬어간다는 산골짜기 오지 마을에 사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혜영 씨(62세) 부부가 있다. 정선 토박이인 두 사람은 11년 전, 퇴직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일구던 화전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40여 년 전, 남편의 환한 미소에 홀딱 반한 혜영 씨는 친정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선에서도 가장 험한 오지 마을에 시집오게 됐단다. 밥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혜영 씨는 이 6년간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음식을 배웠다. 특히 시어머니 비법대로 만든 '닭개장'이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척박한 산골 생활의 지혜가 담긴 밥상, 정선의 토박이 음식을 만난다.
전라북도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바다로 향하는 금강의 여정 막바지에, 조선시대에는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번성했던 포구 웅포가 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 지역으로 돌고래까지 출몰했던 웅포는, 바닷물이 막히면서 잡히는 어종의 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었다. 남편과 함께 맛조개를 잡아서 군산에도 내다 팔고, 그래도 남아서 해 먹었던 음식이 바로 '맛조개전'. 이제 포구의 풍경은 달라졌지만, 음식에 얽힌 추억과 맛은 변함없이 토박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동요 속 고향 마을처럼, 변옥철 씨(67세)가 사는 춘천의 상걸리는 봄이면 골짜기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 골'이라 불렸다. 춘천 토박이인 옥철 씨가 '꽃 골'에 시집온 지도 벌써 45년 째. 산나물을 뜯어다 넣고 막장을 넣고 자작하게 끓인 '뽀글장'은 한 솥을 끓이면, 일주일 정도 물을 부어가며 몇 번이고 다시 끓여서 먹었다. 지금도 생각날 때 가끔 만들어 먹지만, 그때마다 코 끝 찡한 그리움이 묻어난다는 기억의 밥상. 눈물겹던 시절을 담고 있는 춘천의 토박이 밥상은 어떤 맛일까?
태어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뚝심 있게 지켜가는 맛. 진짜 고향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정!
고향은 늘 그리운 감정을 동반한다.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다. 요즘 같은 때, 태어난 곳에 뿌리 내리고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한 곳에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온 사람을 우리는 '토박이'라고 부른다. 그들도 젊었을 땐 도시의 삶을 갈망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고향은 그들에게 평생 삶의 터전이었고, 도시로 떠난 이들이 아스라한 추억으로 떠올리는 고향의 맛이 그들에겐 일상에 올라오는 밥상이 된다. 시대가 변하고 취향도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음식의 맛과 경험은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음식은 한 시대를 이해하는 역사이자 삶의 기록이기도 하다. 고향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뚝심 있게 지켜가는 '토박이만 아는 진짜 밥상'을 만나러 가 본다.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은 태백산의 지붕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악지대. 구름도 쉬어간다는 산골짜기 오지 마을에 사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혜영 씨(62세) 부부가 있다. 정선 토박이인 두 사람은 11년 전, 퇴직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일구던 화전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40여 년 전, 남편의 환한 미소에 홀딱 반한 혜영 씨는 친정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선에서도 가장 험한 오지 마을에 시집오게 됐단다. 밥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혜영 씨는 이 6년간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음식을 배웠다. 특히 시어머니 비법대로 만든 '닭개장'이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척박한 산골 생활의 지혜가 담긴 밥상, 정선의 토박이 음식을 만난다.
전라북도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바다로 향하는 금강의 여정 막바지에, 조선시대에는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번성했던 포구 웅포가 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 지역으로 돌고래까지 출몰했던 웅포는, 바닷물이 막히면서 잡히는 어종의 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었다. 남편과 함께 맛조개를 잡아서 군산에도 내다 팔고, 그래도 남아서 해 먹었던 음식이 바로 '맛조개전'. 이제 포구의 풍경은 달라졌지만, 음식에 얽힌 추억과 맛은 변함없이 토박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동요 속 고향 마을처럼, 변옥철 씨(67세)가 사는 춘천의 상걸리는 봄이면 골짜기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 골'이라 불렸다. 춘천 토박이인 옥철 씨가 '꽃 골'에 시집온 지도 벌써 45년 째. 산나물을 뜯어다 넣고 막장을 넣고 자작하게 끓인 '뽀글장'은 한 솥을 끓이면, 일주일 정도 물을 부어가며 몇 번이고 다시 끓여서 먹었다. 지금도 생각날 때 가끔 만들어 먹지만, 그때마다 코 끝 찡한 그리움이 묻어난다는 기억의 밥상. 눈물겹던 시절을 담고 있는 춘천의 토박이 밥상은 어떤 맛일까?
-
등록일 01:00
-
등록일 04.04
-
등록일 04.04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